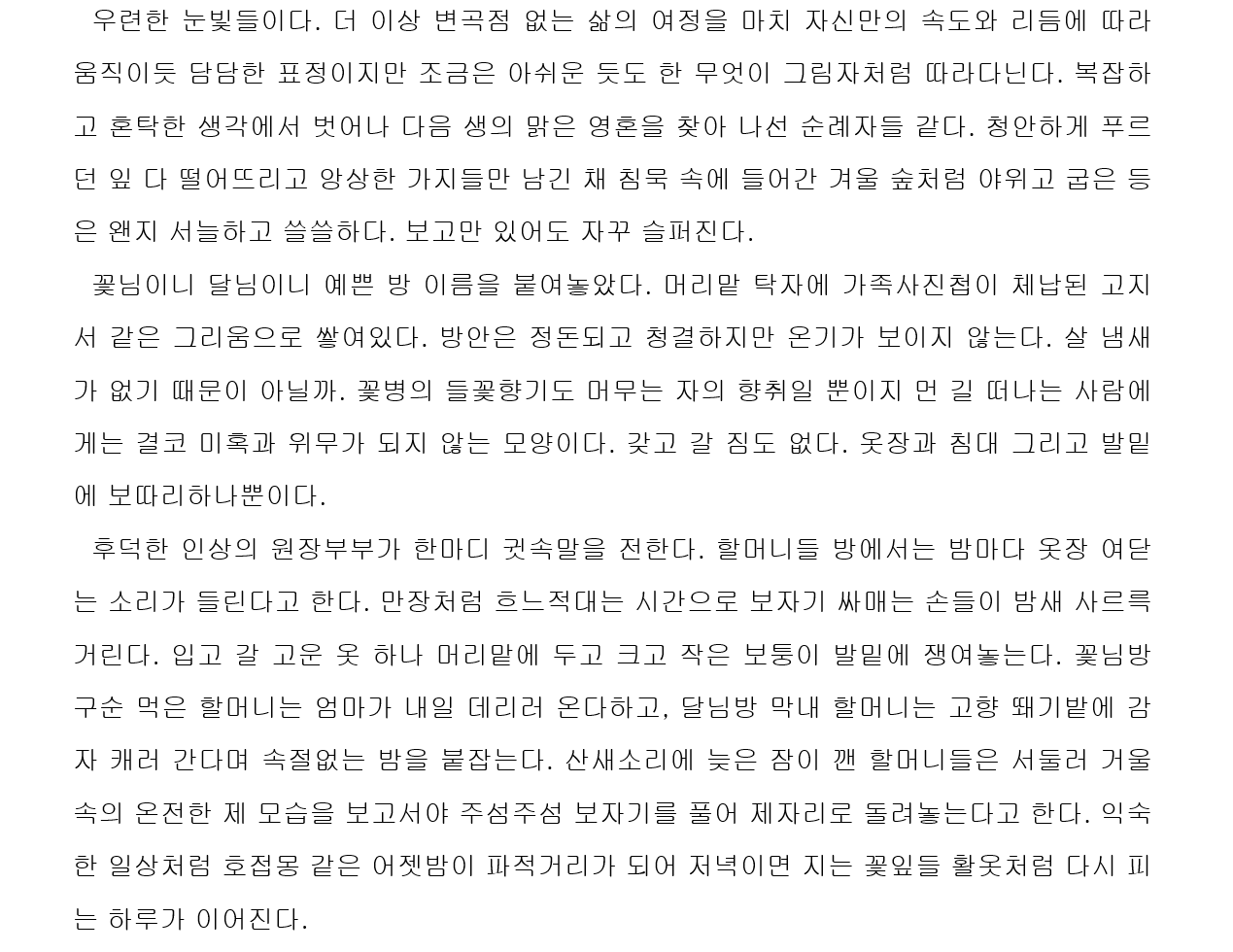당선인 김옥자
달무리 속으로 언뜻언뜻 구름이 흘러들다 사라지는 밤, 정월대보름 놀이를 하느라 한껏 들뜬 여흥이 가시기전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차에서 내리더니 보호자를 데리러 왔다고 했다. 농한기를 맞아 도시에 사는 지인들과 관계의 밥을 짓고 집으로 돌아오다 아버지는 속도의 바퀴에 무참(無慘)하게 부딪쳤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오빠와 언니에게 당부의 말도 일러 둘 겨를도 없이 그 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위중했던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어른들의 말이 적응되고도, 근 1년여의 투병생활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진 대퇴부까지 석고 깁스를 하고 목발에 의지한 채 집으로 오셨다. 한 집안의 대들보이자 기둥처럼 튼튼했던 몸이 사고의 후유증 때문인지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왼쪽 어깨가 앞으로 치우치면서 게가 걷는 형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게걸음은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났다.
서식환경과 외향적인 특성이 다양한 게는 한 쌍의 집게발과 네 쌍의 다리로 종횡무진 갯벌을 오고 간다. 아버지 역시 푹푹 빠지는 세상 속에서 마른 곳과 젖은 곳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의 파고와 맞서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파도가 지나간 자리엔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상처를 지닌 채 당신의 건재함을 보이려는 듯 세상의 파고 속에서 잠시도 자신을 풀어 놓는 일 없이 게걸음을 치며 앞을 향해 나아갔다. 까치발을 든 민꽃게처럼 수게의 기개(氣槪)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게딱지의 단단함 속에 자신의 가장 여린 부분을 감추고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필 '아버지 게밥 짓는다'
수필 '아버지 게밥 짓는다' 썰물을 밀어낸 너른 벌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게가 숨구멍을 오가며 무기물을 걸러 내거나 갯지렁이 바다 생명의 사체를 먹이로 찾고 있는 중이다. 게가 먹이를 찾는 것이나 아버지가 세상의 바다에서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게걸음 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불편한 다리로 분주히 걷는 모습에선 언제나 인내의 짜디짠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일 년 농사를 준비하며 관계의 밥 짓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품앗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듯, 주위 사람들에게 지청구를 주며 완고함을 보이기 위해 게걸음은 지속되었다. 게가 옆으로 기어가다 길이 아닌 곳에 처박힐망정 당신 사전엔 굽힐 줄도 모르고 포기도 없었다.
게는 위험을 감지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을 때 빈 소라껍질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거나 뻘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긴다. 하지만 아버진 그러지 않았다. 게는 몽글몽글 밥을 짓고 있었다. 뻘과 모래밭에 수 천 수만 개의 밥을 지어 놓았다. 연신 앞발 두 개를 얼굴에 비벼대며 거품을 물었다 뱉어 낼 때마다 게밥의 숫자는 늘어났다. 너울성 파도 한 번이면 와르르 쓸려나갈 저 밥들, 아버지가 지어 놓은 밥들은 수시로 파도에 쓸려 나갔다. 하우스 세 동의 배추 농사가 그랬고, 천오백 평 감자 농사가 가격 폭락으로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 한우 값 폭락으로 반도 못 건진 비용들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며 더욱 더 절름거리게 만들었다. 어린 게들의 왕성한 식욕을 위하여 아버지의 게걸음은 오금도 펴지 못한 채 세상의 바다에서 게걸음을 치며 내달려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몸은 옆으로 치우치며 점점 더 빠른 게걸음이 되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분명 당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셨을 게다.
게는 열 개의 다리중 하나라도 부러지면 게로서의 능력을 잃는다.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후 다리만 와지끈 부러지고 깨진 것이 아니었다. 속도의 바퀴에 다리가 깨진 순간, 당신의 꿈과 희망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픈 다리와 함께 상실되었음을 철이 들고서야 알았다. 나와 가족들은 "아버지! 다쳐서 아픈 다리는 괜찮으시냐"고 묻지도 못했다. 아니 그 얘길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다. 마치 금기사항이라도 된 것처럼 모두가 함구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살가죽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를 어루만져 드리지도 못했다. 한쪽 어깨가 옆으로 치우치며 게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을 아버진 묵묵히 혼자서 감내해야만 했다.
철이 없어 아버지가 지어 놓은 보리 섞인 밥이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소금기에 절은 짠내가 싫어 아버지의 고단함을 외면한 적이 많았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서야 삶은 짭조름 간을 맞추며 살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터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감추듯 어떤 상황이나 낯선 변화에 집게발을 번쩍 들어 대항하는 게처럼 단단한 날을 세웠던 아버지였다. 게는 늘 까치발을 들고 짠물 가득한 세상에서 분주히 움직인다. 그가 뻘 구멍을 아지트로 삼고 쉬는 시간 역시도 마른 곳이 아니듯 아버지의 쉼터 역시 그랬다. 게가 생존을 위해 밥을 짓느라 집게발로 연신 얼굴을 비벼대며 게거품을 무는 것처럼 아버지는 삶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누구나 세상의 바다에서 게걸음을 걷는 형상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세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비틀거리며 게걸음을 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매사 어긋나버린 꿈을 향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보였어도, 아버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내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온전치 못한 다리를 짜디짠 물에 담금질을 하며 게밥을 짓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게는 집게발로 연신 얼굴을 비벼대며 거품을 물며 몽글몽글 밥을 지어 놓을지언정 흔들리며 걸어 온 발자국은 남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 놓은 밥을 퍼 먹고 있는 오늘, 여덟 형제가 그 자식을 위해 다시 세상의 파고를 넘나들며 또 다른 밥을 짓고 있는 중이다.